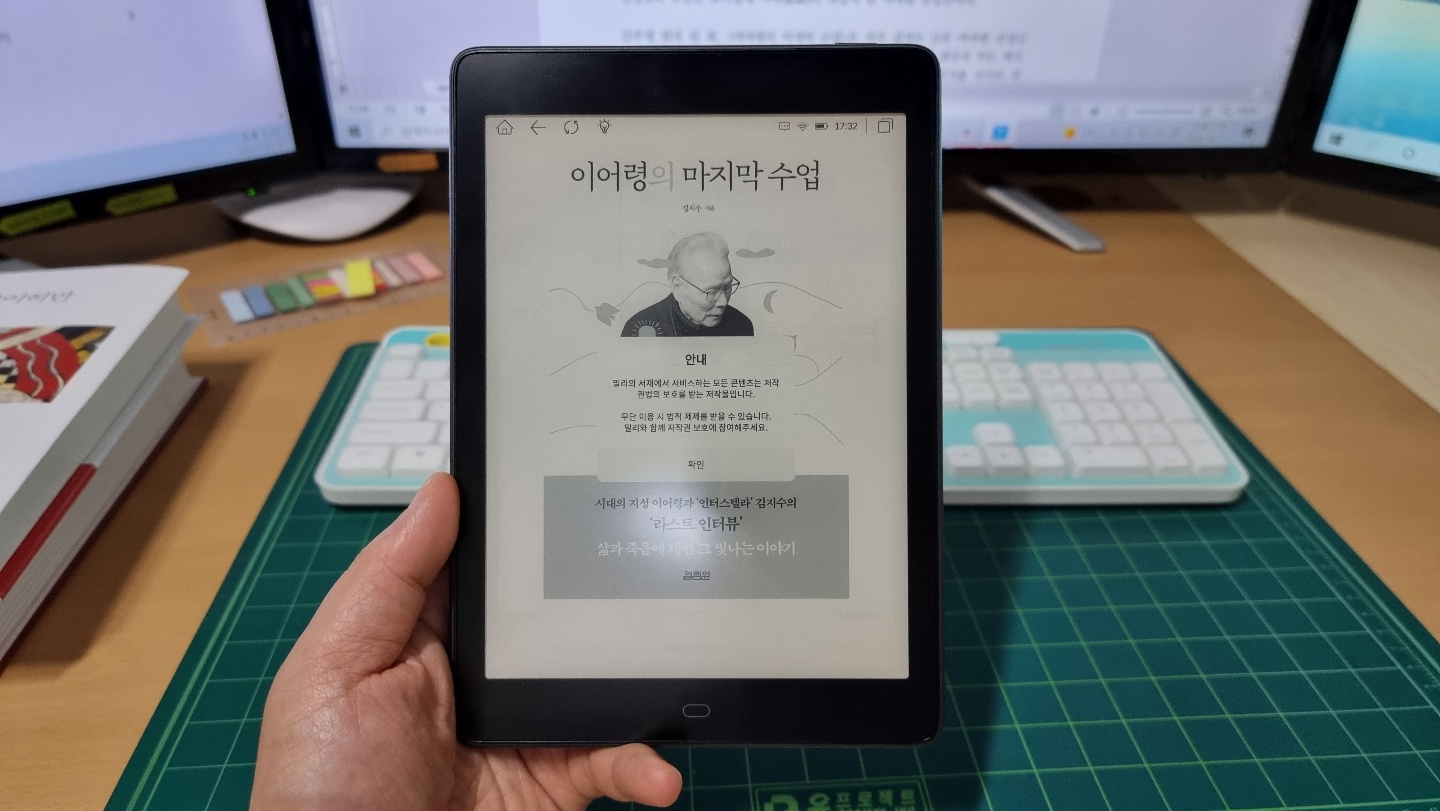
스승은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옳은 길을 제시하며 또한 이정표와 같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긴다. 스승은 버팀목과 같아서 내가 좌절할 때 그 존재만으로도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운다. 그래서 그들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가 보다.
나에게도 이런 스승이 있다. 소년 시절부터 날 믿고 끝없이 응원해준 부모 같은 선생님과 무한한 호기심에 사숙(私淑)의 대상이 된 이어령 선생님이다.
금주에 읽게 된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저자 김지수 님과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를 담은 이야기이다. 마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연상케 하는 책으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남겨진 세대에게 전할 유물 같은 메시지를 저자의 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책을 다 읽은 어제, 선생님의 영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넘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준비하던 소식이지만 막상 부고를 듣고 나니 심란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난 88서울올림픽 때 잠실구장의 고요함을 기억한다. 관중석을 꽉 채운 인파가 굴렁쇠를 끄는 소년의 등장으로 순간적 고요함이 흘렀던 장면을, 선생님의 말씀대로 미나리꽝에서 울려 퍼지는 개구리 소리가 작은 돌소리에 잠시 고요해지는 그 정적처럼 말이다.
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 내용)의 비유를 좋아한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 탈출하는 탕자가 결국 굶주림에 굴복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았을 때 느꼈던 인간의 따뜻함과 한계에 동감한다. 그런데도 다시 탕자와 같은 길을 밟는 동생에게 ‘너는 돌아오지 말라’는 인간으로서의 의지에 감동한다.
난 사잇돌처럼 살아오신 선생님의 인생을 존경한다. 인간이 지향하는 영성에 이르는 길이 지정의 사다리를 통해서라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하는 디지로그의 개념, 인터뷰(interview)는 대담(對談)이 아닌 상담(相談)이라는 점, 컴퍼니(company)가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란 의미를 기억하며 손잡이가 달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난 선생님께서 제망매가를 통해 말씀하신 윤회의 해석과 이를 통해 알게 된 바퀴의 역사, 이러한 독창성과 서사적 연관성, 이 모두를 아우르는 논리력을 존경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라는 즐거움 속에 살다 가신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난 진실의 탐구와 선악의 윤리 문제,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를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인식하기로 했다. 또한 현실의 삶과 이상 속의 삶을 구분하여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진, 선, 미를 초월한 죽음의 문제를 잊지 않고 되뇌기로 했다.
선생님은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짧은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끝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머니 속에 유리그릇처럼 죽음을 대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미소 지으며)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아리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적이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전자책 440~441쪽)
저자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글에 이어령만 보이는 것은 존경하는 스승을 대하는 제자의 태도임을 알기에 더욱 감동한다.
시대의 선생이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어령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독후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편한 편의점 - 김호연 / 나에게도 단골손님으로 찾을 수 있는 그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0) | 2022.03.13 |
|---|---|
| 지리의 힘 - 팀 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0) | 2022.03.06 |
| 고도를 기다리며 - 사뮈엘 베케트 지음, 오증자 옮김 /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 (0) | 2022.02.23 |
| 존 롤스 정의론 - 황경식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0) | 2022.02.11 |
| 행복의 정복 –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 행복은 이처럼 탈환해야 하는 정복의 대상이다. (0) | 2022.02.07 |




댓글